 로그인을 하시면 메디칼타임즈의
로그인을 하시면 메디칼타임즈의다양한 연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시 등록한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 오피니언
- 젊은의사칼럼
부끄러움 많은 실습을 돌았습니다

-
가
-
순천향대학교 의대 본과 3학년 오명인
투비닥터 사진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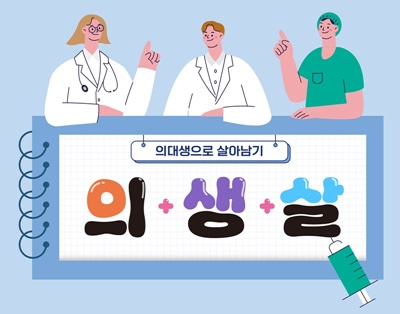
2년 반의 휴학을 마치고 드디어 학교로 돌아왔다. 첫 실습은 심장내과였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 빳빳한 나의 가운처럼, 나의 뇌도 새것이 된 것 같았다. 그런 내 상황을 모르는 교수님께서 첫날 첫 회진에서 바로 질문을 던지셨다.
"몸이 엄청 붓고, 단백뇨가 이렇게 심하네. 뭘 생각해야 하지?" 주말에 벼락치기로 질문 족보를 암기했는데 신장 질문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당황해서 눈알만 굴리던 나를 보는 교수님의 표정이 생생하다. 마치 고등학생이 인수분해를 못 할 때 짓는 표정이었다. 한참 정적이 흐르다 교수님은 공부 한번 해보라 흘리시고 빠르게 사라지셨다.
회진이 끝나자마자 빠르게 검색했다. 곧 내가 신증후군을 대답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때 느낀 감정은 너무 오랜만에 느껴보는, 아주 강렬한 부끄러움이었다. '그래 단백뇨가 심하고 부종이 있어, 신증후군을 생각했어야 하고…' 그러나 그 다음은 또 백지가 펼쳐졌다. 어떤 질환이 신증후군을 일으키는지, 치료는 뭐였는지…
그 모든 것들은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매우 중요하게 공부했으며, 적어도 기본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교수님의 반응이 이해가 가면서 하루 종일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2년 반은 나의 모든 의학적 지식을 휘발시키기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다음 날 심초음파실에서 교수님을 마주쳤을 때 공부해 오라는 말씀이 진심이었을까 말버릇이었을까 몇 번이고 고민하다, 조심스레 말씀드렸다. "어제 공부해 오라고 하신 환자, 신증후군 같습니다" 교수님의 반응을 보았을 때 말버릇으로 하신 질문이었음이 판정이 났지만, 왠지 기뻐 보이셨다.
"맞아 신증후군 환자지… 그래 이 환자가 너 케이스 환자로 하자. 조금 어려워 보여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공부하는 셈 치지 뭐. 그 환자 너 케이스로 해라!" 나는 어제의 멍청함을 약간이나마 갚은 것 같아 기뻐하면서 환자 번호를 받았다. '조금 어려워 보여서 고민하고 있었는데'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처음으로 EMR에 로그인하고 환자의 혈액 검사 결과 창을 열었을 때, 검사 항목의 절반 정도가 빨갛게 되어있는 것을 보고 나서야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동기들은 급성 심근경색, 판막 질환과 같은 전형적인 심장내과 케이스를 받은 반면, 내 환자는 신장이 근본적인 원인이 되어 심부전이 온 케이스로 전신에 수치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었다.
내 친구들의 환자는 모두 수술 후에 퇴원한 후에도, 나의 환자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이 주 내내 입원 중이었다. 나는 매일 환자를 보러 갔다. 오늘 나아지는 듯하다 내일 다시 몸이 붓고 다시 빠지고를 반복하고, 그에 따라 온갖 수치도 함께 오르내렸다.
전날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 굳이 교수님 회진을 따라 돌고, 밤에는 들여다봐도 이해가 안 가는 EMR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이 약은 왜 썼을까, 저 약은 왜 안 썼을까. 고민하다 보면 답 없이 새벽이 그냥 지나갔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의 나를 조금 말려주고 싶다. 그러나 그 시절의 나는 모자람을 만회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발표 전날까지도 자신이 없어 밤새 자료를 붙잡고 있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50페이지가 넘는 케이스 발표 자료는, 부족함을 감추려는 안간힘의 결과였다. 그러나 발표가 끝난 뒤 돌아온 지적은 의외로 단순했다. 아주 기본적인 약물을 틀린 것이었다.
그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고, 며칠 밤을 새운 노력은 부끄러움 속에 묻혀버렸다. 이 부끄러움을 또 어느 세월에 치워야 하는지 걱정하면서 첫 실습을 마쳤다. 한 학기 실습을 마무리하며 돌아보니, 나는 무수히 많은 순간 당황하고 부끄러워하면서 "공부해 오겠습니다"를 외쳤다. 그때는 괴로웠지만, 돌이켜보면 그 감정이야말로 나를 책상 앞으로 불러낸 가장 강한 원동력이었다.
적성이란 뭘까. 재능과 비슷한 말일까. 학년은 본과 3학년이지만 머리는 예과로 돌아간 듯한 첫 임상 실습을 지나면서, 나는 못했을 때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분야야말로 진짜 적성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휴학 중 여러 길을 탐험했지만, 한밤중에 좌절하며 만회의 밤을 지새운 일은 결국 의학 공부뿐이었다. 내가 가장 잘한다고 믿는 일이 부정당했을 때 느끼는 감정, 바로 그 부끄러움 때문이다. 오늘도 그 감정을 원동력 삼아 한 장 더 공부한다. 언젠가는 조금 덜 부끄러운 의사가 되어 있기를 바라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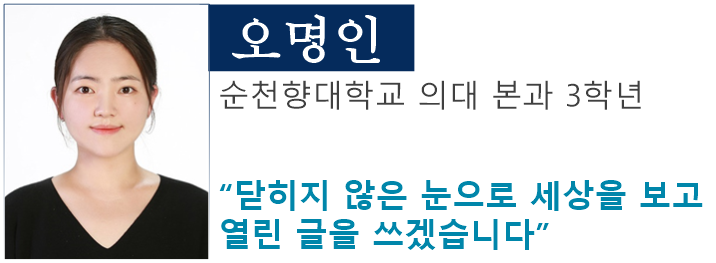

관련기사
- 어느 길인지는 모르겠지만 왈츠를 추자 2025-09-29 05:00:00
- 쉼표의 필요성에 대하여 2025-09-15 05:00:00
- 감정이 만드는 의료인의 길 2025-09-08 05:00:00
- 경계선에서의 이해 2025-09-01 05:00:00
오피니언 기사
- 초고령사회 치매 돌봄 정책 이대로 좋은가? 2025-10-07 09:09:43
- 선을 넘어서 2025-09-29 05:00:00
- 어느 길인지는 모르겠지만 왈츠를 추자 2025-09-29 05:00:00
- 간병급여화, 왜 요양병원은 폐업 우려하나 2025-09-29 05:00:00
- 주치의제, 해법인가 붕괴 촉매제인가 2025-09-22 05:00:00
오피니언 기사
많이 읽은 뉴스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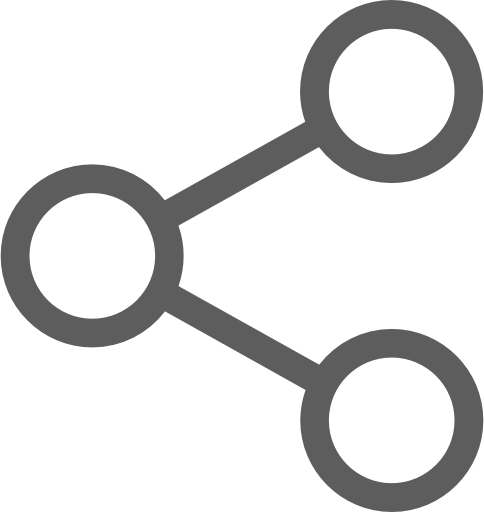








/NewsMain.jpg)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