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을 하시면 메디칼타임즈의
로그인을 하시면 메디칼타임즈의다양한 연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시 등록한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 오피니언
- 젊은의사칼럼
다시 돌아오지 않을 계절

-
가
-
순천향대학교 의대 본과 3학년 오명인
투비닥터 사진팀

어느 가을날 산부인과를 돌 때였다. 교수님들이 모두 학회를 가셔서 오전에 모두 끝나버린 일정에 바로 공부할 거리를 챙겨서 카페로 향했다. 근데 웬걸 가려던 카페가 임시 휴무였다. 숙달된 P인 나는 당황하지 않고 플랜B를 실행했는데 그건 바로 옆에 있는 샌드위치 집에서 무화과 리코타 샌드위치를 사서 호수 공원에 가는 것이었다.
물론 다른 카페를 가서 공부를 하는 플랜 A-1,2,3,4가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날씨가 너무 좋았다고 변명을 한다. 내가 하나 강력하게 확신하는 것은, 눈앞에 온 거짓말 같은 날씨는 절대 돌아오지 않으므로 그때 즉시 즐겨야 한다는 것이다.
부천에 산 지 2년이 되어간다. 나는 어떤 동네나 내가 매트리스를 깔고 눕는 곳이라면 곧잘 좋아하고 뿌리를 내리는데, 이번에 지낸 도시는 그중에서도 애착을 갖기 쉬웠다. 특히 부천의 가을은 더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조바심을 갖게 만든다. 나는 기회만 되면 병원 지하 카페에서 커피를 테이크아웃하고 노트북을 챙겨 공원 한복판 정자에서 공부를 하면서 한점이라도 더 가을을 보고 가려고 안간힘을 썼다.
자전거를 십분 정도 타고 도착한 호수 공원은 작지만 정리가 잘 되어있어서 걷거나 자전거 타기 매우 좋다. 적당히 볕이 드는 자리를 선택해서 샌드위치를 먹기 시작한다. 사실 작년까지 무화과에 취미가 없었는데 이번 여름 오키나와에 가서 아무 생각 없이 산 무화과로 아침을 해 먹은 이후로 한국에서도 계속 무화과를 찾아다녔다. 치아바타에 리코타, 무화과와 루꼴라만 들어간 간단한 샌드위치인데 꽤 비싸고, 매우 맛있다. 샌드위치 위로 햇빛이 흔들린다. 영화 <퍼펙트 데이즈>에서 이 빛을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더라.
손을 털고 조금 걷기 시작한다. 혹시나 해서 책도 챙겨왔다 <고상하고 천박하게>라는 이훤 작가와 가수 김사월의 주고받은 편지 형식의 책이다. 읽다가 인기척이 느껴져 앞을 보니 양볼이 붉은 아기가 나에게 낙엽을 건넨다. 그 사랑스러운 선물을 책 사이에 끼우기 전에 햇빛에 한번 비춰본다.
샛노란 벚나무 낙엽을 덮고 있는 미세한 갈색 반점들, 그 사이를 지나가는 미세한 잎맥,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가늘고 얇은 경계로 갈라지고 그 틈을 햇빛이 채우면서 빛나고 있었다. 무언가를 이렇게 관찰한 적이 너무 오래전 같았다.
가끔 애인과 구글맵으로 세계지도를 보면서 가끔 어디로 여행 가지하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데, 최근에는 생각보다 세상이 너무 좁다는 느낌이 들어서 어이없이 우울해진 적이 있었다. 이 세상의 경험들을 다 묶은 책을 다 읽어버리면, 그 이후에는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었다. 그러나 필요 없는 걱정일지도 모른다. 나는 이미 매년 똑같이 돌아오는 가을을, 이번에 지나가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웃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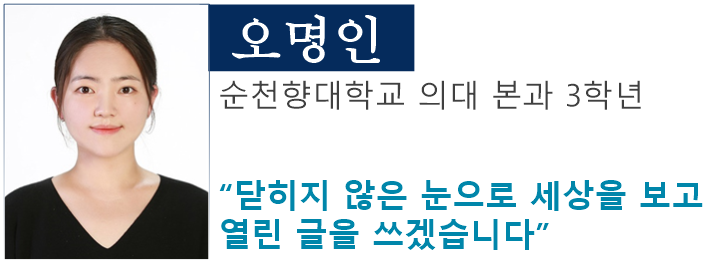

관련기사
- 마라톤 트랙에는 사람이 많다 2025-12-15 05:00:00
-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2025-12-01 05:00:00
- 나를 믿는다는 것은 2025-11-24 05:00:00
- 슬픔을 공부하는 일에 대하여 2025-11-17 05:00:00
오피니언 기사
- 키위를 팔아야 살아남는 대학병원 2025-12-22 05:00:00
- 마라톤 트랙에는 사람이 많다 2025-12-15 05:00:00
- 기술은 '일류' 제도는 '제자리' 2025-12-15 05:00:00
- 대한민국 의료의 위기는 언제까지? 2025-12-15 05:00:00
- 내시경 질평가 불균형 다학회 참여가 해법 2025-12-10 05:30:00
오피니언 기사
많이 읽은 뉴스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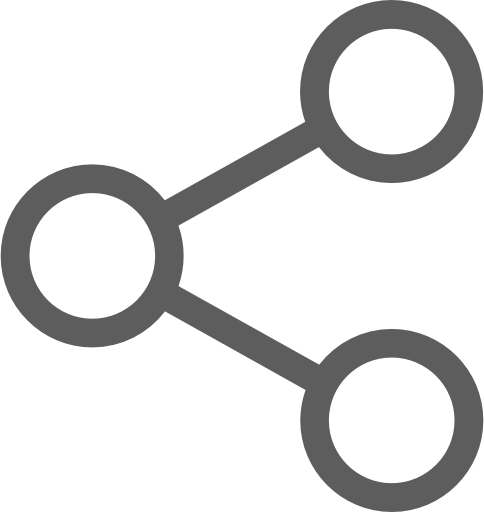








/NewsMain.jpg)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