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을 하시면 메디칼타임즈의
로그인을 하시면 메디칼타임즈의다양한 연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시 등록한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 오피니언
- 젊은의사칼럼
빛나는 희생의 무게

-
가
-
박유진 학생(순천향의대 본과 3학년)


몇달 전, 오랜만에 친한 선배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병원에서 수술 잘하기로 유명하던 한 교수님께서 위암 판정을 받고 입원해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교수님의 별세 소식을 듣게 되었다.
마음이 참 씁쓸했다.
평생 환자와 수술밖에 모르셨던 당신께, 배 전체를 가득 채운 암덩어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 일하며 지내왔던 당신께,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억울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했다.
나는 신경외과 의사가 되고 싶다. 어떤 큰 목표나 포부를 가지고 결정했다기보다는 그냥 신경학도 재미있고 수술도 재밌는데 딱 맞는 게 신경외과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과 3학년이 되어 하루하루 실습을 돌고 교수님들과 전공의 선생님들의 삶을 지켜볼수록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게 느껴진다.
옛날에는 주변 사람들이 다시 생각해보라고, 힘들어서 할 수 있겠냐고 말해도 당당하게 '난 그래도 할 수 있어. 할거야!' 말했지만, 이제는 거짓말이라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 않다. 여느 과가 그렇듯이 전공의 1년차는 바쁘다 쳐도, 전공의 3·4년차 때까지 수술 들어가랴, 환자보랴, 응급콜 받느라 잠 못 드는 과는 그리 흔하지 않을 것이다.
그 덕분에 '병원에서 제일 바쁜 건 정형외과 1년차, 그 다음엔 성형외과 1년차, 다음엔 신경외과 1년차, 다음엔 신경외과 2년차, 3년차, 4년차…' 라는 웃픈 소문도 있다.
그뿐 만이 아니다. 교수가 되어서도 삶은 힘들면 더 힘들어지지, 편해지지는 않는다. 갑작스러운 뇌출혈, 뇌경색으로 온 환자들은 시간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은 항상 병원 2km 근방에 집을 구해야 하며, 특히 뇌혈관을 보는 교수님들은 항상 손이 부족해 전공의만큼 당직을 많이 선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런 무지막지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실제로 그 현실을 목격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신경외과 의사가 되고 싶어' 에서 '신경외과 의사가 되고 싶었'’로 슬그머니 말을 바꾸고 싶어지기도 한다. 아직 신경외과 전공의로서 생활해보지 않은 나도 막상 힘들다는 말만 듣고서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싶어지기에, 실제로 병원에서 일하시고 계신 분들을 보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더욱더 절실히 느껴진다. 아무리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체력과 정신, 그리고 포기와 희생이 뒷받침되어주지 않으면 그것을 평생 업으로 삼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희생. 정말 어려운 결정이다. 그렇기에 몸소 실천하시는 분들을 보면 진심으로 존경심이 든다. 나의 가족, 친구, 인간관계, 그리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환자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웬만한 결단력으로는 쉽게 결정할 수 없다. 그래서도 안되는 것이고 말이다. 내가 신경외과 의사가 되는 것을 고민하는 것도 바로 이런 지점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도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건 '희생'과는 정반대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결핵-비결핵항산균(NTM) 분야 권위자였던 고원중 교수님의 일생을 담은 책 '참의사 고원중'에는 돌아가시던 그 날까지 매일 12시간 이상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던 교수님의 모습이 담겨있다. 교수님의 삶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출근하고 밤 10시가 넘어 퇴근하기 일쑤였고 진통제가 없이 하루를 견디기 힘들었으며 과도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인한 불면증이 반복되다 결국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만 52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다.
고(故) 고원중 교수님과 얼마전 돌아가신 우리 병원의 교수님.
나는 한번도 두 교수님을 직접 만나뵙진 못했지만 어쩐지 그 두 분의 삶은 닮아 있다. 병원에서 의사로 평생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며 지내온 세월들은 비단 그 두 분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이것이 과연 우리 사회의 의료 시스템 문제 때문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고쳐나가야 할지는 점차 고민을 해봐야 하겠지만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순간 만큼은 한 평생 희생하며 살아오신 두 분의 삶을 생각하며 애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희생과 사명감 위에서 환자들과 후배들을 위해 닦아 놓은 그 길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기사
- 국시만 남았다, 끝과 시작의 경계에서 2022-10-11 06:32:59
- "지금 순간을 즐겨라" 슬기로운 예과생활 2022-10-04 05:00:00
- 미디어를 통해 본 현대 사회의 정신적 단면 2022-09-26 05:00:00
- 임상실습하는 학생의사의 고민들 2022-09-19 05:00:00
오피니언 기사
- '의정협의' 적기는 언제일까 2022-10-13 05:30:00
- 피난열차 되어버린 필수의료의 꿈 2022-10-11 06:34:17
- 비의료인에게 “센터” 운영을 맡기는 경우 2022-10-11 06:33:46
- 마약·언어에도 한계 효용…묻지마 처방 대응 나서야 2022-10-11 06:33:25
- 국시만 남았다, 끝과 시작의 경계에서 2022-10-11 06:32:59
오피니언 기사
많이 읽은 뉴스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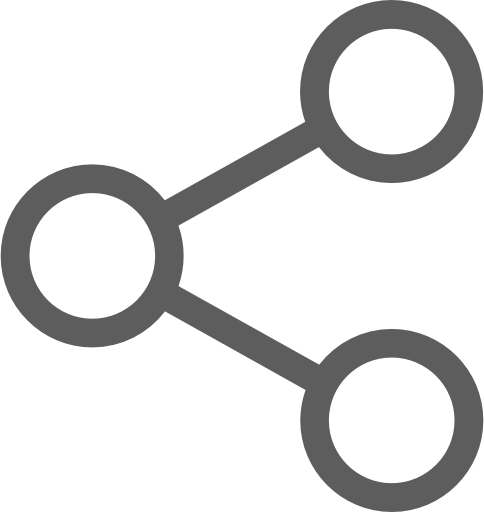




/NewsMain.jpg)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