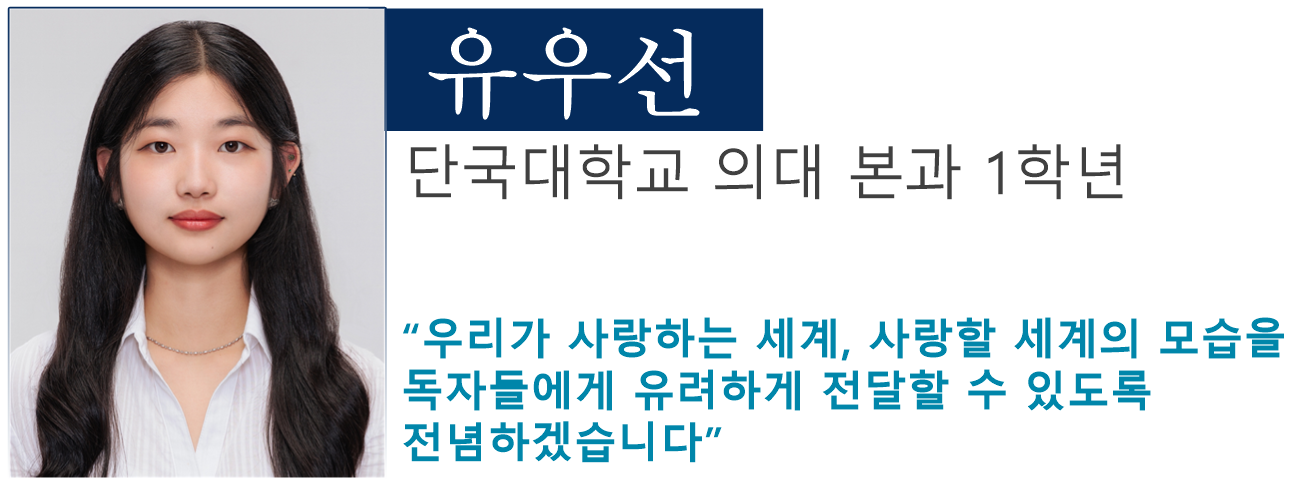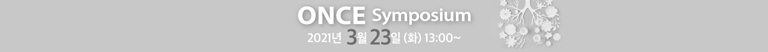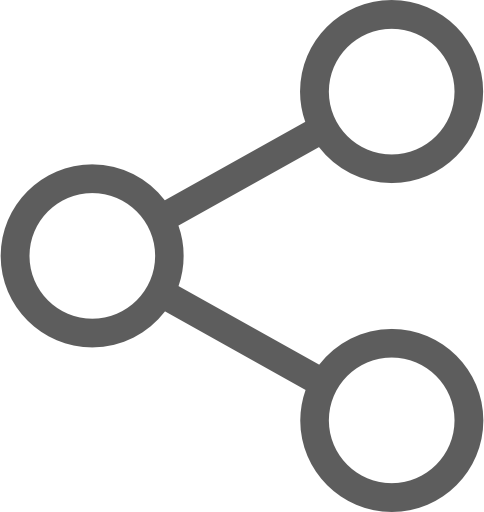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1학년 유우선
투비닥터 편집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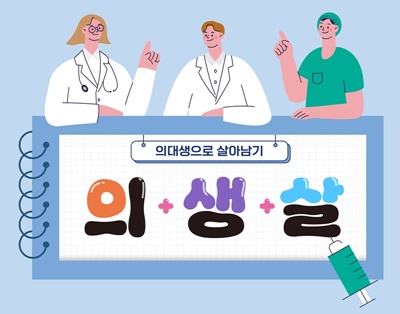
살아오면서 나를 환기시켜주는 많은 대화들이 있는데, 학교 독서 모임에서 좋아하는 두 학번 위 언니와의 대화는 특히나 여러 면에서 그랬다. 그때 아마 우리는 왜 의대에 왔는가, 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 같다. 아니면 왜 꿈을 가졌는지, 어떤 기준으로 직업을 선택했는지.
대강의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나를 비롯한 동기 두 명은 '사람을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으면서 나의 삶을 잘 영위할 수 있으니까'라고 복사한 듯 똑같은 대답을 했다. 대답한 나도 그렇게 느낀 만큼 언니도 그렇게 읽은 듯싶었다. 각자의 대답을 다 들은 언니는 덤덤하게 되물었다.
"학문적인 이유로 이 과를 선택한 사람은 많지 않은가 보네?"
우리 사회가-그리고 나도-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한 가지는 대학이 '학교'라는 것이다. 학문을 배우는 곳. 공부하고 싶은 과목을 골라서 과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이다. 언니의 질문은 그래서 근본적인 물음이었다. 그때 표는 안 냈지만 살짝 당황했다. 너무 정곡을 찔렸기 때문이다.
나는 학문이 아니라 오로지 소명 의식을 가지고 이 과를 선택했기 때문에, 언니의 질문이 유독 맨살에 얼음 닿듯 날카롭게 와닿았다. 당시에는 괴롭기도 했다. 한참 의료대란의 한복판을 지나면서 내가 믿고 선택한 의사의 '소명 의식'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반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언니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고 싶어서, 그리고 마음속의 반문에 응답하고 싶어서 휴학 1년을 오로지 다 썼다. 청년의사 인터뷰를 가서 언론의 맛을 보고, 불로소득에 대한 묘수를 찾고자 주식 시장을 탐색했으며, 생판 처음 들어보는 신소재의 균열 체계를 시험하는 연구실의 논문과 씨름했다.
전공과 한 발자국 멀어져 맛본 세상은 참 신기하고, 재미있고, 가슴이 뛰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공부하고 싶은 것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에 안 그래도 사랑하던 세상이 더 사랑스러워 보였다. <시계태엽 오렌지>의 알렉스마냥 지구에 뽀뽀나 하고 싶다는 말이 적확했다... 좀 남사스러운 표현이지만.
그렇지만 불현듯 깨달은 점은, 내가 더 배우고 싶다 느끼는 것들은 분야에 상관없이 결국은 '의업'에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 경제학과 사회학을 배우고 싶어도 레지던트 과정을 다 밟아 병원 생리를 안 후에 배우고 싶었고, 생분해되는 Strain sensor에 대한 논문을 봐도 전에 들었던 메디픽셀 심혈관 조영술에 이미 쓰이고 있을까, 하고 궁금해졌다. 모로 가도 사람 보는 의사가 하고 싶었다. 다른 걸 해도 의술에 도움 되는 것을 하고 싶었다.
거기까지 생각이 가닿자, 비로소 언니가 한 질문에 느지막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만한 마음이 생겼으니까. 의학을 공부하는 것이 좋다. 모든 학문에 대한 나의 탐독은 결국 의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나는 이 학문이 아주 많이 궁금해졌다.
이 골격 덕에 본과 생활을 시작한 지 어언 한 달이 다 된 지금도 나는 어마어마한 공부들과 과제들을 꽤 즐기고 있다. 매일 100장이 넘는 강의록이 쏟아지고, 당장 월요일에 수업한 내용을 달달 외워 목요일 아침에 시험을 봐야 한다. 그런 과목이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씩 쏟아지고, 시험은 또 어찌나 자주 보는지 매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은 시험을 보는 날로 고정되어 있다.
특히 우리 학교의 경우는 본과 1학년 때에 역학 조사 실습이 있어서 조별 과제 발표 준비도 틈틈이 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것이 진심으로 흥미롭다. 각종 세균에 대해서 배우거나 이 병변은 어떤 기전으로 생기게 되는지, 자료들을 머릿속에 욱여넣고 있으면 정말 내가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구나, 하는 뿌듯한 마음에 허리를 곧추세우고 수업을 듣는다.
단순히 의학이 좋다는 이유를 넘어, 의학에 몰입하게 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다. 바로 나의 Professionalism 때문이다. 프로페셔널하다는 것은 나름의 정의가 있지만, 나는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어떤 한 -특히나 직업적 분야에만- 영역에 국한하지 않는다.
모든 일을 함에 있어, 심지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빈틈없이,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좋다. 흠 잡히고 싶지 않다. 내가 만들어낸 결과물과 그 과정을 누군가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싫다(이건 피드백과는 다른 영역의 문제임을 분명히 밝힌다). 돌이켜 보면 나는 늘 그런 태도를 지향했고, 내가 그렇게 해내지 못했을 때 무척이나 자책했던 것 같다.
이러한 스스로에 대한 효능감은 곧바로 내 행복과 직결되어 내 삶을 왈츠로 지휘할 것인지, 진혼곡으로 지휘할 것인지 결정한다. 그래서 나는 모든 공부에 정성껏 임한다. 환자를 볼 때의 마음으로, 이 한 문제가 나중에 누군가를 사(死)의 구덩이에서 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이 마음가짐으로 살아내는 하루하루는 아름다운 선율의 '왈츠'가 되어준다. 늘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든 간에, 프로페셔널하게.
브랜드 르메르의 뮤즈이자 디자이너인 사라 린 트란은 한 인터뷰에서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일. 나에게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믿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와 독립성은 일에서부터 온다. 나는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일함으로써 나는 성장하고 또 발전한다. ...(중략)... 구성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일, 새로운 디자인을 완성하는 일, 패션쇼를 준비하는 일 등 모든 과정에 배움이 있다. 일을 통해 겪는 모든 경험을 정말 사랑한다"
장인의 쾌감이 느껴지는 답변.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자부심과 정성을 가지고 나의 본업에 임하고, 그로 인해 인생을 왈츠처럼 흥겹게 사는 여자가 되고 싶다.
그러려면 일단 매일을 열심히 살아야 한다. 매일을 꽉꽉 채워서, 마구 헤매면서, 배움을 향해서. 이제는 나의 온전한 열정을 차지하게 된 의학이 멋진 무도를 개최해주어, 더욱 열심히 살 자신이 생기는 요즈음이다.
10년 뒤면 서른넷이다. 나는 그때 어디에 있을까? 무얼 더 알고 있을까? 왈츠 같은 여자가 되어있을까?